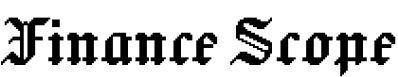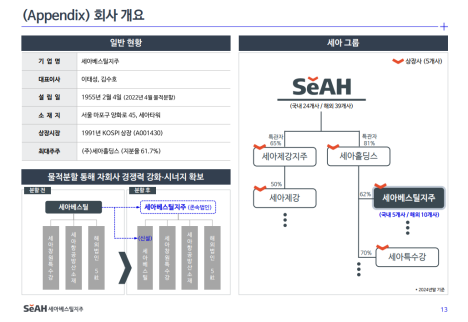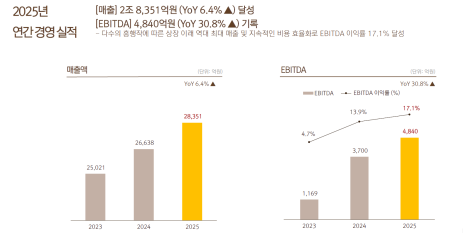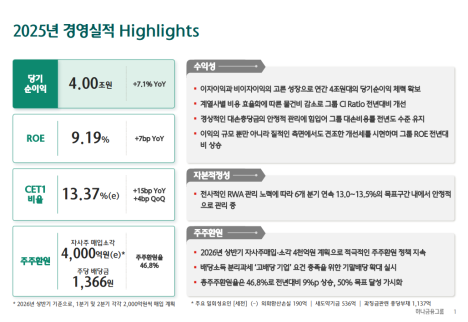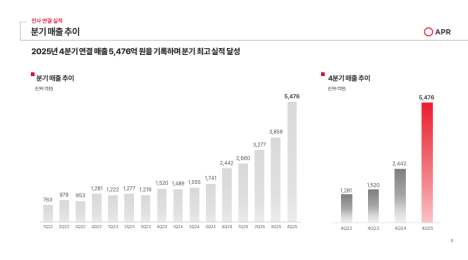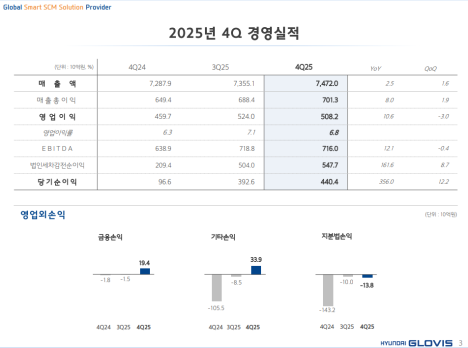미국이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로 변모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인텔 CEO에게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하거나, US스틸을 인수하면서 일본제철로부터 ‘황금주식’(중요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주)을 확보하는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조정됐으며, 방위산업 및 희토류 분야에 대해 국방부 직접투자 등 정부주도의 산업 개입이 대폭 강화됐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상대로 규제와 보복을 단행하고 대형 민간기업에 ‘황금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사적 영역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WSJ는 "미국적 특색을 지닌 국가자본주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개입이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달리 한시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경제 운영 원리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한 연방준비제도(Fed), 불리한 통계를 발표한 노동통계국(Labor Bureau) 등에 대해 수장 교체 압박을 가했고, 은행·로펌 등도 트럼프의 비위에 어긋나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WSJ,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주요 기관에 대해 가차 없이 대응하는 트럼프식 스타일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는 권력 집중·연줄·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보다 낮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중국도 국가통제 강화 이후 철강·자동차 산업의 초과생산 문제로 인해 기업이익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 시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국가의 경제 개입을 확대하는 ‘국가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수많은 사례는 시진핑 체제 하 중국의 사회주의적 통제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미국의 특수성 때문에 중국식 모델이 온전히 이식되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향후 그 성공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