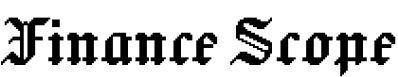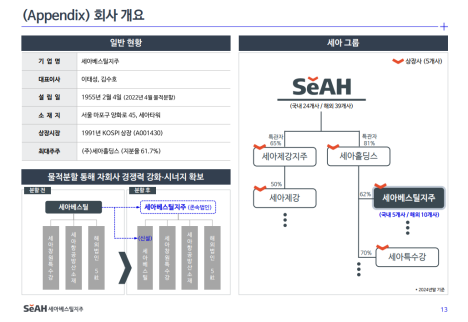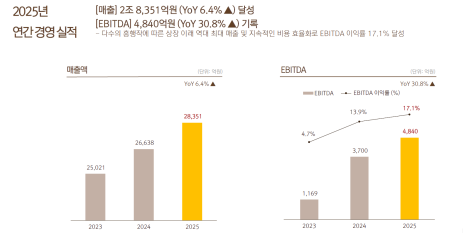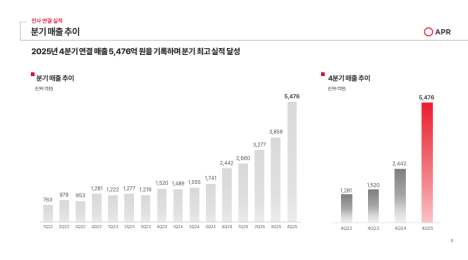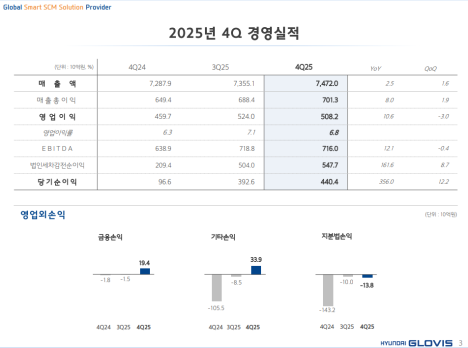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명분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시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제를 이유로 해당 구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마켓워치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일 스페이스X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AI 발전은 대규모 지상 데이터센터에 의존하고 있지만, 전력과 냉각 수요를 고려할 때 지상 솔루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AI가 규모 확장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궤도상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최대 100만 기의 위성군(constellation)을 발사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과학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우주 환경이 지상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우주에서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난제로 꼽힌다. 진공 상태인 우주는 내부 열을 외부로 내보내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냉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조닛 노스이스턴대 컴퓨터·전기공학 교수는 "우주에서 냉각되지 않은 컴퓨터 칩은 지구보다 훨씬 빠르게 과열돼 손상될 수 있다"며 해결책으로 대형 라디에이터 패널을 이용해 적외선 형태로 열을 방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이런 기술은 국제우주정거장(ISS) 등 소규모 시스템에만 적용돼 왔다"며 머스크가 구상한 데이터센터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하고 취약한 구조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위성군 운영에 따른 충돌 위험과 우주 잔해 문제도 우려 요인이다.
머스크는 최근 규제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7년간 운영하며 저속 파편 발생 사고가 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스타링크 위성은 약 1만기 수준이다. 100만 기 규모의 데이터센터 위성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엔지니어 출신인 존 크라시디스 버펄로대 교수는 "이처럼 방대한 위성군을 운용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는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위성들은 시속 약 2만8천㎞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돌 시 매우 격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령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주 환경에서 데이터센터 장비의 성능 저하나 부품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주 태양에너지 기업 에테르플럭스의 바이주 바트 CEO는 "지상 데이터센터는 문제가 생기면 인력을 투입해 수리할 수 있지만, 궤도상에는 그런 수리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입자가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부담 요인이다. 이를 대비해 여분의 칩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모펫네이선슨은 최근 보고서에서 스페이스X가 데이터센터용 위성 100만 기를 구축·운영하는 데 매년 약 5조 달러(한화 7330조원)에 달하는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 제작비는 물론 수천 차례의 로켓 발사 비용, 로켓 생산 비용, AI 칩 구매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추정치다.
도이체방크 분석팀 역시 우주 방사선이 칩의 성능 저하를 가속할 수 있다며, 궤도상 데이터센터의 유지·보수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의 구상이 장기적인 비전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에는 상당한 의문이 따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